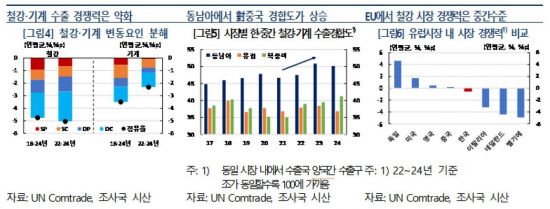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추가되는 이른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주요국 가운데 한국에서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차등 규제는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떨어뜨리는 성장 페널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관련 제도 조정 필요성이 제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공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자산·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체계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와 지위, 공시·회계 등 특정 행위에 따라 규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경제법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규제가 설정되며 기업이 성장하면 새로운 의무가 순차적으로 더해지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김 교수팀은 국내 법제를 분석한 결과 12개 법률에 총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기업 규제를 규모로 세분하지 않으며 법령에 별도의 대기업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는 지배구조와 외부감사 등 상장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독점 규제는 카르텔·남용·결합 등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주별 회사법 체계도 대기업 범주를 나눠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는 두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국 역시 회사를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로 나누지만 공개회사를 다시 규모로 쪼개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목적으로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대기업을 다시 규모별로 나눠 누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상장 여부와 시장에서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규제가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규모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자산 구간별로 규제를 계속 덧붙이는 동시에 상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서 이를 중복해 기업 성장에 구조적 부담이 생기는 체계"라고 분석했다.
독일도 상법에서 자본회사를 소·중·대규모로 나누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감사 등 회계 영역에서의 기술적 기준에 그친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일본 회사법은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200억엔 이상 회사를 대회사로 규정하지만 이를 다시 세분해 규모별로 차등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경제 고성장기에 도입된 기업 규모별 차등 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완화라는 명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성장 정체가 이어지는 지금은 기업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

![[포토] 폭설에 밤 늦게까지 도로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000920610800.jpg)

![[포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앞두고 팝업스토어 오픈](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4160199219_1762492560.jpg)
![[포토] 국회 예결위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0410898931_1762479667.jpg)
![[포토] 예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화보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82431778689.jpg)

![[포토]두산 안재석, 관중석 들썩이게 한 끝내기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1a1c4d0be7434f6b80434dced03368c0_P1.jpg)

![[작아진 호랑이③] 9위 추락 시 KBO 최초…승리의 여신 떠난 자리, KIA를 덮친 '우승 징크스'](http://www.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8238.jpg)
![블랙핑크 제니, 최강매력!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ed1b2684d2d64e359332640e38dac841_P1.jpg)
![블랙핑크 제니, 매력이 넘쳐!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c5a971a36b494f9fb24aea8cccf6816f_P1.jpg)
![[포토]첫 타석부터 안타 치는 LG 문성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2/news-p.v1.20250902.8962276ed11c468c90062ee85072fa38_P1.jpg)
![[포토] 아홉 '신나는 컴백 무대'](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514134.jpg)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9369.jpg)
![[포토] 김고은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236.jpg)

![[포토] 박지현 '순백의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414.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완벽한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457.jpg)
![[포토] '삼양1963 런칭 쇼케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008977281.jpg)
![[포토] 발표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206916880.jpg)
![[포토] 언론 현업단체, "시민피해구제 확대 찬성, 권력감시 약화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23135571578.jpg)
![[포토]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 리뉴얼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2544910604.jpg)

![[포토]끝내기 안타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산 안재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0df70b9fa54d4610990f1b34c08c6a63_P1.jpg)
![[포토] 김고은 '상연 생각에 눈물이 흘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613.jpg)
![[포토] 아이들 소연 '매력적인 눈빛'](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492.jpg)
![[포토]두산 안재석, 연장 승부를 끝내는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b12bc405ed464d9db2c3d324c2491a1d_P1.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쥴리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358.jpg)


![[JPM 2026]휴젤 "2028년 9000억 매출 목표…美 비중 30%로"](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6011609220093837_1768522921.jpg)
![[JPM 2026]같은듯 다른 삼성의 美전략…고객 옵션·韓공장 효율 'UP'](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6011608574093737_1768521460.jpg)
![[JPM 2026]서진석 셀트리온 대표 "4중 작용 비만치료제, 요요·부작용 줄일것"](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6011606562693538_17685141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