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관광재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1/20260101142338720510.jpg) [사진=서울관광재단]새해의 문턱에서 사람들은 늘 비슷한 질문 앞에 선다. 어디서부터 다시 힘을 얻을 것인가. 서울관광재단이 1월을 맞아 제안한 도심 여행 코스는 그 답을 ‘말’에서 찾는다. 붉은 말의 해를 상징하듯, 서울 동쪽의 일출 명소 용마산에서 하루를 열고, 조선시대 말을 기르던 마장동과 말을 피해 형성된 피맛골 골목을 따라 걷는 여정이다. 도심 한복판이지만, 이 코스에는 서울이 쌓아온 시간과 삶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서울관광재단]새해의 문턱에서 사람들은 늘 비슷한 질문 앞에 선다. 어디서부터 다시 힘을 얻을 것인가. 서울관광재단이 1월을 맞아 제안한 도심 여행 코스는 그 답을 ‘말’에서 찾는다. 붉은 말의 해를 상징하듯, 서울 동쪽의 일출 명소 용마산에서 하루를 열고, 조선시대 말을 기르던 마장동과 말을 피해 형성된 피맛골 골목을 따라 걷는 여정이다. 도심 한복판이지만, 이 코스에는 서울이 쌓아온 시간과 삶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용마산과 서울 풍경 [사진=서울관광재단]
용마산과 서울 풍경 [사진=서울관광재단] ◆새벽을 여는 산, 용마산
서울 동쪽에 자리한 용마산은 도심형 일출 산행지로 손꼽힌다. 이름부터 말과 깊은 인연을 품고 있다. ‘용마가 날아올랐다’는 전설에서 비롯됐다는 설과, 조선시대 이 일대가 말 목장이었던 만큼 귀한 말이 태어나기를 기원하던 봉우리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도 자연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고, 새벽 시간대에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첫차를 타고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인근에서 산행을 시작하면 일출 전에 정상에 닿을 수 있다. 등산로는 완만하게 정비돼 있어 초보자도 부담이 적다. 정상에 오르면 한강을 따라 펼쳐진 서울 전경과 롯데월드타워를 포함한 도심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온다.
아차산·망우산과 능선을 공유해 코스 선택도 다양하다. 광나루역 아차산 생태공원 코스, 중곡동 이호약수터 코스, 망우역사공원 코스 등 대부분 2시간~2시간 30분 내외로 오르내릴 수 있다.
산행을 마친 뒤에는 인근의 새로운 공간들도 눈길을 끈다. 올해 문을 연 ‘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지상 최대 10m 높이의 목재 데크 산책로로, 숲 위를 걷는 듯한 감각을 준다. 겨울철 안전을 위한 논슬립 패드와 조명도 설치돼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인근 용마폭포공원은 겨울 동안 폭포 대신 눈썰매장을 운영해 아이들과 함께 들르기 좋다.
 마장시장 앞 조형물 [사진=서울관광재단]
마장시장 앞 조형물 [사진=서울관광재단] ◆말을 기르던 자리, 마장동
용마산에서 내려오면 서울의 또 다른 ‘말의 자리’가 이어진다. 마장동은 조선시대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말 사육장, ‘양마장’이 있던 곳이다. 한양 도성 동쪽 외곽의 넓은 평지와 수자원을 갖춘 이 지역은 군사와 왕실을 위한 말을 기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말의 시대가 저물면서 마장동의 풍경도 바뀌었다. 1958년 가축시장이 이전해 오고, 1961년 시립도축장이 들어서며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시장의 활기는 지금도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이어진다. 도축장은 사라졌지만, 이곳은 여전히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축산물 시장이다.
마장동은 ‘사진 찍기 좋은 동네’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서울이 성장해온 방식과 여전히 이어지는 노동과 생업의 풍경이 남아 있다. 특수부위를 고르고 흥정하는 손길, 상인들의 목소리, 오래된 식당들까지, 이곳은 지금도 살아 있는 서울의 단면을 보여준다.
시장 인근에 자리한 청계천박물관은 이 여정을 한층 입체적으로 만든다. 청계천의 조성과 변화를 통해 한양의 탄생부터 현대 서울까지 도시의 시간을 조망하는 공간이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산업화와 복원 이후의 모습까지 청계천의 역할을 다양한 사료와 유물로 풀어낸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2026년 3월 29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청계천 사람들: 삶과 기억의 만남’에서는 청계천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피맛골 입구 [사진=기수정 기자]
피맛골 입구 [사진=기수정 기자] ◆말을 피해 숨은 길, 피맛골
여정의 끝은 종로의 피맛골이다. 피맛골은 조선시대 말을 탄 양반과 관리들이 오가던 종로 대로를 피해 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골목이다. 말발굽과 위세를 피해 한 발 물러난 자리에서 사람들은 낮은 시선으로 걷고, 머물고, 삶을 이어갔다.
종로 육의전의 번성과 함께 성장한 피맛골은 오랜 시간 서민들의 술집과 밥집, 여관과 상점이 모인 생활 공간이었다. 고등어구이와 빈대떡, 순대국 같은 음식들은 피맛골을 서울의 대표적인 맛집 골목으로 만들었다. 재개발로 원형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아직 종로 곳곳에 남아 있다.
르메이에르 빌딩 안쪽으로 들어서면 피맛골의 이름을 잇는 골목이 이어지고, 광화문 D타워 저층부와 종로 일대 곳곳에서도 골목의 감성을 만날 수 있다. 피카디리 극장 주변에 남은 노포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말을 타지 않고, 말의 길을 비켜 걷던 사람들의 선택이 만든 골목. 그 피맛골에서 여행은 다시 사람의 속도로 돌아온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도심 여행은 그래서 화려하기보다 단단하다. 서울의 시간과 삶을 따라 걷는 일, 그 자체가 한 해를 여는 힘이 된다.
아주경제=기수정 기자 violet1701@ajunews.com

![[포토] 폭설에 밤 늦게까지 도로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000920610800.jpg)

![[포토] 예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화보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82431778689.jpg)

![[포토]두산 안재석, 관중석 들썩이게 한 끝내기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1a1c4d0be7434f6b80434dced03368c0_P1.jpg)
![블랙핑크 제니, 매력이 넘쳐!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c5a971a36b494f9fb24aea8cccf6816f_P1.jpg)
![[작아진 호랑이③] 9위 추락 시 KBO 최초…승리의 여신 떠난 자리, KIA를 덮친 '우승 징크스'](http://www.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8238.jpg)
![블랙핑크 제니, 최강매력!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ed1b2684d2d64e359332640e38dac841_P1.jpg)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9369.jpg)
![[포토] 국회 예결위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0410898931_1762479667.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완벽한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457.jpg)
![[포토]첫 타석부터 안타 치는 LG 문성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2/news-p.v1.20250902.8962276ed11c468c90062ee85072fa38_P1.jpg)
![[포토] 김고은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236.jpg)
![[포토] 발표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206916880.jpg)
![[포토] '삼양1963 런칭 쇼케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008977281.jpg)

![[포토] 박지현 '순백의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414.jpg)
![[포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앞두고 팝업스토어 오픈](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4160199219_1762492560.jpg)

![[포토] 언론 현업단체, "시민피해구제 확대 찬성, 권력감시 약화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23135571578.jpg)
![[포토] 아이들 소연 '매력적인 눈빛'](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492.jpg)

![[포토]끝내기 안타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산 안재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0df70b9fa54d4610990f1b34c08c6a63_P1.jpg)
![[포토]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 리뉴얼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2544910604.jpg)
![[포토]두산 안재석, 연장 승부를 끝내는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b12bc405ed464d9db2c3d324c2491a1d_P1.jpg)
![[포토] 김고은 '상연 생각에 눈물이 흘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613.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쥴리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358.jpg)
![[포토] 아홉 '신나는 컴백 무대'](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514134.jpg)
![[신년사] 최휘영 문체부장관 "K-컬처,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키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1/2026010115351949178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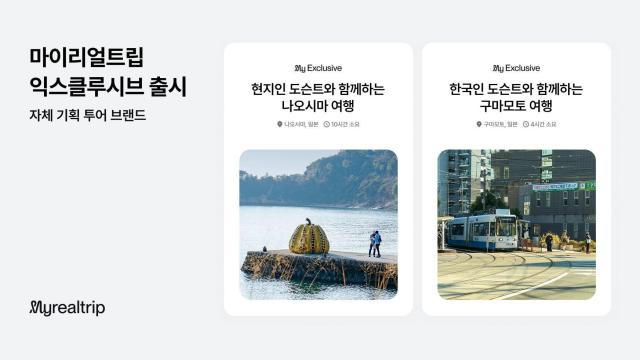
![[2025 관광 결산] 사상 최다 방한 외래객…회복 넘어 확장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1804228080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