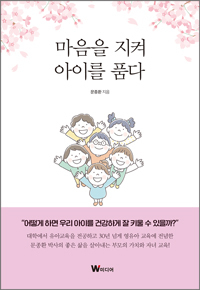주인공인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로, 아무것도 몰랐다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세상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세상과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의 세상은 다르다. 학교엔 여러 동네 아이들이 있다. 달동네 아이들과 주택가 아이들, 아파트 아이들, 드물지만 고급 빌라촌에 사는 아이들이 한데 뒤섞여 있다. 그러므로 학교엔 여러 계급의 아이들이 존재한다. 하류층 아이에서부터 상류층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은 부모의 재산, 평소 사용하는 물건 등에 따라 친구들을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등으로 분류해 부르고 사는 동네까지도 수저 색깔로 불러 달동네는 흙수저도 못돼 똥수저 동네가 되고 주택가는 흙수저 동네, 아파트는 은수저 동네, 고급 빌라촌은 금수저 동네로 부른다. 방서현 작가는 어린아이 눈을 통해 대도시 서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왜곡 없이 그리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계급화된 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오 함께, 세상이 왜 세모꼴 모양을 한 피라미드인지 진지하게 묻는다.
 내가 버린 도시, 서울/방서현/문이당/1만6000원 2022년 첫 장편소설 ‘좀비시대’ 이후 4년 만에 출간한 두 번째 작품이다. 수저의 이름으로 불리는 네 개의 동네가 도로 하나 차이로 촘촘하게 맞닿아 있다.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동네들은 지명 대신 오로지 ‘똥수저-흙수저-은수저-금수저’로 표상된다. 주인공 ‘나’는 그중 ‘똥수저 동네’, 혹은 ‘달동네’로 불리는 산동네에서 부모도 없이 길에서 자신을 주워다 기른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다. 초등학교는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라가는 곳이 아니라, ‘수저’를 기준으로 서열을 세우는 공간으로 전락한다. 학교에서 숙제로 ‘우리 집 아빠 차 소개하기’, ‘우리 집 자랑거리 써오기’처럼 가정 형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주제로 인해, 아이들은 서로 사는 동네를 바탕으로 계급을 나누고 그 속에서도 힘과 외모, 부모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세세하게 서열을 짓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도덕성과 인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서열의 아이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버린 도시, 서울/방서현/문이당/1만6000원 2022년 첫 장편소설 ‘좀비시대’ 이후 4년 만에 출간한 두 번째 작품이다. 수저의 이름으로 불리는 네 개의 동네가 도로 하나 차이로 촘촘하게 맞닿아 있다.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동네들은 지명 대신 오로지 ‘똥수저-흙수저-은수저-금수저’로 표상된다. 주인공 ‘나’는 그중 ‘똥수저 동네’, 혹은 ‘달동네’로 불리는 산동네에서 부모도 없이 길에서 자신을 주워다 기른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다. 초등학교는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라가는 곳이 아니라, ‘수저’를 기준으로 서열을 세우는 공간으로 전락한다. 학교에서 숙제로 ‘우리 집 아빠 차 소개하기’, ‘우리 집 자랑거리 써오기’처럼 가정 형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주제로 인해, 아이들은 서로 사는 동네를 바탕으로 계급을 나누고 그 속에서도 힘과 외모, 부모의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세세하게 서열을 짓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도덕성과 인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서열의 아이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계급 간 이동 가능성을 틀어막고, 그 계급에 따른 삶을 밀어붙이는 압력은 ‘나’의 사고 속에 부러움과 결핍을 새겨넣지만, 정말로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꿈꿀 여백은 남겨두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오래도록 그림을 그려왔더라도 그것을 진로로 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나’의 화폭에는 상상력과 꿈이 부재한다. ‘나’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더 어두워져만 간다. 이미 ‘나’를 버린 이 도시를 버리고 다른 어딘가로 떠난다 해도 지리적 위치만 바뀔 뿐 떠난 곳에도 여전히 수저 계급론이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한 보호자까지 잃은 ‘나’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을 버려도 또 다른 서울이 아가리를 벌린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내가 버린 도시, 서울’을 펴낸 방서현 작가. “문득 꿈속 세계가 아니, 숲속 밖 세상이 떠오릅니다. 숲 속 밖 세상은 내게 감옥이었어요. 세모꼴 모양을 한 거대한 피라미드 감옥……. 저마다 가진 자본에 따라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등 수저 계급으로 나뉘었으며 흙수저는 1억 원 이하, 동수저는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50억 원 이상, 금수저는 자산 100억 원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칸이라도 더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경쟁하고 타인을 짓밟았죠.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게……. 그러나 여기 숲속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수저 같은 게 없고 화폐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피라미드 같은 것도 없고요. 그저 오솔길이 있고, 옹달샘이 있고, 메아리 소리가 있고 아득한 고요함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버린 도시, 서울’을 펴낸 방서현 작가. “문득 꿈속 세계가 아니, 숲속 밖 세상이 떠오릅니다. 숲 속 밖 세상은 내게 감옥이었어요. 세모꼴 모양을 한 거대한 피라미드 감옥……. 저마다 가진 자본에 따라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등 수저 계급으로 나뉘었으며 흙수저는 1억 원 이하, 동수저는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50억 원 이상, 금수저는 자산 100억 원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칸이라도 더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경쟁하고 타인을 짓밟았죠.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게……. 그러나 여기 숲속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수저 같은 게 없고 화폐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피라미드 같은 것도 없고요. 그저 오솔길이 있고, 옹달샘이 있고, 메아리 소리가 있고 아득한 고요함이 있을 뿐이에요.” 문학평론가 최의진은 “방서현은 이 소설에서 수저 계급론이 양산하는 답답한 믿음과 체념을 재료로 하여, 도로 하나를 두고도 너무도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길’든 듯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서울을 그려낸다. 양극화가 재난처럼 삶을 삼키더라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고요하고 끔찍한 풍경을 가로지른다”고 평했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포토] 예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화보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82431778689.jpg)
![블랙핑크 제니, 최강매력!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ed1b2684d2d64e359332640e38dac841_P1.jpg)
![[포토]두산 안재석, 관중석 들썩이게 한 끝내기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1a1c4d0be7434f6b80434dced03368c0_P1.jpg)
![[포토] 발표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206916880.jpg)
![블랙핑크 제니, 매력이 넘쳐!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c5a971a36b494f9fb24aea8cccf6816f_P1.jpg)
![[포토] '삼양1963 런칭 쇼케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008977281.jpg)
![[포토] 박지현 '순백의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414.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완벽한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457.jpg)

![[포토] 아이들 소연 '매력적인 눈빛'](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492.jpg)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9369.jpg)
![[포토] 김고은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236.jpg)
![[작아진 호랑이③] 9위 추락 시 KBO 최초…승리의 여신 떠난 자리, KIA를 덮친 '우승 징크스'](http://www.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8238.jpg)
![[포토] 국회 예결위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0410898931_1762479667.jpg)
![[포토]첫 타석부터 안타 치는 LG 문성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2/news-p.v1.20250902.8962276ed11c468c90062ee85072fa38_P1.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쥴리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358.jpg)
![[포토]끝내기 안타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산 안재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0df70b9fa54d4610990f1b34c08c6a63_P1.jpg)
![[포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앞두고 팝업스토어 오픈](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4160199219_1762492560.jpg)

![[포토]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 리뉴얼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2544910604.jpg)
![[포토] 언론 현업단체, "시민피해구제 확대 찬성, 권력감시 약화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23135571578.jpg)
![[포토] 김고은 '상연 생각에 눈물이 흘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613.jpg)
![[포토]두산 안재석, 연장 승부를 끝내는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b12bc405ed464d9db2c3d324c2491a1d_P1.jpg)

![[포토] TXT 범규 '반가운 손인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518398.jpg)
![[포토] 아홉 '신나는 컴백 무대'](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5141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