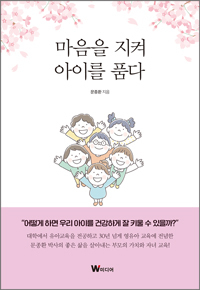후카다는 오랜 동거 끝에 1940년 시인 기타바타케 야호와 정식 부부가 되었고, 이듬해 5월 결혼 피로연을 열었다. 도쿄대 재학 시절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야호와 만나 사랑에 빠져 11년간 동거를 이어온 그였다.
 리시리다케 그런데 미래를 보장해야 할 결혼 피로연에서 그는 고교 시절 첫 사랑 고바 시게코와 재회하면서 오히려 결혼 생활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게코와 함께 온천에 가게 됐는데, 이때 시게코와 브레이크 없는 사랑에 빠진 것이다. 이듬해에는 시게코와 아들을 낳기도 했다.
리시리다케 그런데 미래를 보장해야 할 결혼 피로연에서 그는 고교 시절 첫 사랑 고바 시게코와 재회하면서 오히려 결혼 생활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게코와 함께 온천에 가게 됐는데, 이때 시게코와 브레이크 없는 사랑에 빠진 것이다. 이듬해에는 시게코와 아들을 낳기도 했다. 후카다는 다가오는 파국에 서둘러 군에 입대했고, 곧 중국 칭다오에서 난징까지 태평양전선 전투부대에 배속됐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온 그가 향한 곳은 아내 야호가 있는 가마쿠라가 아닌, 첫 사랑 시게코와 아들이 있던 유자와였다.
그는 결국 1947년 야호와 이혼했고, 야호는 후카다가 자신의 글을 표절해 작품을 발표했다고 폭로했다. 야호와 동거 직후 소설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고 대학과 출판사 모두 그만두고 글쓰기만 전념해온 그였지만, 야호의 폭로로 작가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끝나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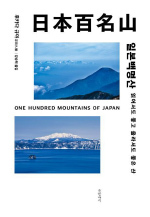 후카다는 시게코와 재혼한 뒤 문단을 떠나 조용히 유자와에 낙향했다. 유자와로 갈 때 그가 가져간 것은 고작 열몇 꾸러미의 짐이 전부였다. 그는 이때부터 문단의 평판이나 비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산의 문학자로 복무하기 시작했다.
후카다는 시게코와 재혼한 뒤 문단을 떠나 조용히 유자와에 낙향했다. 유자와로 갈 때 그가 가져간 것은 고작 열몇 꾸러미의 짐이 전부였다. 그는 이때부터 문단의 평판이나 비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산의 문학자로 복무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일본의 산에 모두 오른 뒤 100좌의 일본 명산을 선정해 소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생각은 이미 전쟁 전부터 해왔고, 한동안 산악잡지에 이라는 제목으로 25좌까지 연재해왔지만, 잡지가 폐간되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후카다는 산에 오르고 또 올랐다. 수많은 시간을 산에서 보냈고, 산 위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며 한뎃잠을 잤다. 내려와선 산에 대한 글을 썼고, 틈틈이 히말라야 관련 문헌을 번역 소개했다. 1959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60세가 되는 1963년 글을 마무리 짓고, 1964년 여름 마침내 『일본백명산』 초판을 출간했다. 변신과 와신상담의 결과이자 오랜 산생활의 결과물이었다.
책은 출간 즉시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매년 판을 거듭하면서 지금도 출판되고 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책은 이례적으로 1965년 제16회 요미우리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학평론가 고바야시 히데오는 문학상 추천사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저자는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산에는 산격이 있다고 말한다. 산격에 관해 좀더 자신 있는 비평적 언사를 얻기 위해 저자는 50년의 경험이 필요했다. 문장의 수일은 그로부터 왔다. ”
세계 등산인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명저로 꼽히는 후카다 규야의 『일본백명산』의 한국어판(강승혁 옮김, 글항아리)이 무려 반세기만에 국내에서 번역 출간됐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마치 선물 같은 책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일본에서 명산을 선정하는 발상은 그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후카다의 책은 산을 다룬 이전의 책들과 달랐다. 그는 기슭에서 산을 보지 않고 정상까지 모두 오른 뒤에야 글을 썼기 때문이다. 일부는 몇 번을 물러났다가 다시 오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후기에서 이렇게 당당히 쓸 수 있었다.
 후카다 규야 “이 책에서 꼽았던 백 곳의 명산은 전부 내가 그 정상에 섰다. 백을 골라야 하는 이상, 그 몇 배의 산에 올라봐야만 했다. 어느 정도 수의 산에 올랐는지 세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산에 오르는 일은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도록 거의 끊인 적이 없었기에, 여러 산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신이 있다. ”(696쪽)
후카다 규야 “이 책에서 꼽았던 백 곳의 명산은 전부 내가 그 정상에 섰다. 백을 골라야 하는 이상, 그 몇 배의 산에 올라봐야만 했다. 어느 정도 수의 산에 올랐는지 세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산에 오르는 일은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도록 거의 끊인 적이 없었기에, 여러 산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신이 있다. ”(696쪽) 후카다는 “내 눈은 신처럼 공평하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산의 품격과 산의 역사, 산의 개성이라는 세 기준으로 삼아 1500m 이상의 산 가운데 일본 명산 100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잠깐. 산의 품격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산이라고 감탄하는 것이어야 한다. 높이에서는 합격했어도 범상한 산은 고르지 않는다. 험준함이나 굳셈, 아름다움이랄까, 무언가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오는 점이 없는 산은 고르지 않는다. 사람에도 인품의 고하가 있듯이 산에도 그것이 있다. 인격이 아닌 산격이 있는 산이어야 한다. ”(697쪽)
그는 일본 백명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70퍼센트 정도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나머지 30퍼센트는 고심이 컸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모든 조건이 맞는 산임에도 자신이 오르지 못해 넣을 수 없었던 산도 몇 개 있었다고 고백한다. 100좌에서 탈락한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구구하기조차 하다.
“레분섬에서 해질 무렵 바라보았던 리시리다케의 아름답고 강렬한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산은 바다를 가르고 서 있었다. 리시리후지라고 부르지만, 가지런한 형태라기보다 오히려 날카로운 바위가 우뚝 솟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바위는 석양에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28쪽)
바다를 가르고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해발 1721m의 홋카이도 리시리다케산을 소개하는 것으로 책은 시작한다. 후카이도 9좌에서 시작해 도호쿠, 조신에쓰와 기타칸토, 북 알프스, 우쓰쿠시가하라와 미나미칸토, 중앙 알프스, 호쿠리쿠와 시코쿠의 산들을 거쳐서 큐슈의 산까지 이어진다.
특히 해발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후지산 대목에선 “일본 제일의 산”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한번쯤 후지산 등산을 꿈꾼다며 “민중적인 산” “대중의 산”이라고 평가한다.
책은 해발 1936m의 큐슈 가고시마현의 미야노우라다케산을 마지막으로 일본 백명산의 소개를 마친다. 그는 미야노우라다케산의 정상을 오른 순간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사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밝아왔던 이튿날 아침은 또다시 쾌청. 야쿠시마조릿대와 만병초가 뒤섞인 한가로운 길을 올라 미야노우라다케의 정상에 섰다. 정상 가까이에는 30cm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다. 내다보이는 것은 모두 산이고 그 산 너머는 바다이다. 지금까지 어딘가의 깊은 산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지만, 정상에서 에워싼 바다를 바라보고 나니, 비로소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야노우라다케는 해안의 어느 마을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꼭대기에서 보이는 것은 산과 바다뿐이다. ”(692쪽)
 미야노우라다케 책은 후카다가 이전에 발표한 산에 관한 여러 수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것은 그가 오랜 세월 『일본백명산』을 준비했고 글을 깎고 다듬었다는 방증이다. 덕분에 책의 내용은 보다 조밀해졌고, 행간은 더욱 알차졌다. 책은 쉽지 않지만 현학적이지 않고, 담담하지만 메마르지 않다. 용어의 과잉 역시 없다.
미야노우라다케 책은 후카다가 이전에 발표한 산에 관한 여러 수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것은 그가 오랜 세월 『일본백명산』을 준비했고 글을 깎고 다듬었다는 방증이다. 덕분에 책의 내용은 보다 조밀해졌고, 행간은 더욱 알차졌다. 책은 쉽지 않지만 현학적이지 않고, 담담하지만 메마르지 않다. 용어의 과잉 역시 없다. 그는 나중에 일본등산협회 부회장이 됐고,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며 실크로드 산들을 탐험하기도 했다. 그의 죽음조차 비범했으니, 1971년 3월 그는 야마나시현 해발 1704m의 지가다케(茅ヶ岳)산 정상 부근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이다.
책이 출간된 지 60년이 지나서 산을 둘러싼 환경이나 여건은 많이 달라져 있다. 예를 들면, 어지간한 산에는 로프웨이가 달려 있고, 산머리 턱밑까지 자동차도로가 나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일부 폐허로 변한 곳조차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의 산을 등산할 때 가장 많이 읽히고, 여전히 유용한 참고가 되는 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백명산』은 지금도 많은 등산가들이 최고의 소장품으로 여긴다. 일본에 100좌의 명산이 있는 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떠나는 한, 이 책은 계속 읽힐 것이다. 책장을 넘기다보면 지금도 산을 걷고 있는 후카다의 모습이 어른거릴지도.
그러니까, 1903년 이시카와현 가가(加賀)시에서 종이인쇄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후카다는 12세 때 많은 초중학교 소풍코스였던 가가시 남서부에 위치한 해발 942m의 후지사가가다케(富士?ヶ岳)에 오른 게 계기가 돼 등산에 흥미를 갖게 됐다. 도쿄대 교양학부에 입학한 뒤 학교 등산부에 가입하기도 했다. 하이쿠 필명조차 ‘구산(九山)’이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어렸을 때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묻는 어머니의 물음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소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중이나 거지요.” 그때 소년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집 이층에서도, 소학교 교문에서도, 붕어 낚시하는 강변에서도, 그러니까 고향 어디에서도 보이는 하쿠산(白山)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해질녘, 바다로 가라앉는 태양의 은은하게 남은 노을을 받아 하쿠산이 장밋빛으로 물드는 한때는 다시없을 아름다움이었다. 금세 엷은 쥐색으로 저물어 가기까지의 잠깐 동안의 미묘한 색채의 추이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602쪽)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사진=글항아리 제공


![[포토] 예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화보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82431778689.jpg)
![블랙핑크 제니, 최강매력!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ed1b2684d2d64e359332640e38dac841_P1.jpg)
![[포토] 발표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206916880.jpg)
![[포토]두산 안재석, 관중석 들썩이게 한 끝내기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1a1c4d0be7434f6b80434dced03368c0_P1.jpg)
![블랙핑크 제니, 매력이 넘쳐!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c5a971a36b494f9fb24aea8cccf6816f_P1.jpg)
![[포토] '삼양1963 런칭 쇼케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008977281.jpg)
![[포토] 박지현 '순백의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414.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완벽한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457.jpg)

![[포토] 아이들 소연 '매력적인 눈빛'](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492.jpg)
![[포토] 국회 예결위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0410898931_1762479667.jpg)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9369.jpg)
![[포토] 김고은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236.jpg)
![[작아진 호랑이③] 9위 추락 시 KBO 최초…승리의 여신 떠난 자리, KIA를 덮친 '우승 징크스'](http://www.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8238.jpg)
![[포토]첫 타석부터 안타 치는 LG 문성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2/news-p.v1.20250902.8962276ed11c468c90062ee85072fa38_P1.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쥴리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358.jpg)
![[포토]끝내기 안타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산 안재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0df70b9fa54d4610990f1b34c08c6a63_P1.jpg)
![[포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앞두고 팝업스토어 오픈](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4160199219_1762492560.jpg)

![[포토]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 리뉴얼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2544910604.jpg)
![[포토] 언론 현업단체, "시민피해구제 확대 찬성, 권력감시 약화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23135571578.jpg)
![[포토] 김고은 '상연 생각에 눈물이 흘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613.jpg)
![[포토]두산 안재석, 연장 승부를 끝내는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b12bc405ed464d9db2c3d324c2491a1d_P1.jpg)
![[포토] 아홉 '신나는 컴백 무대'](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514134.jpg)

![[포토] TXT 범규 '반가운 손인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518398.jpg)